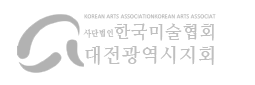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한 쟁점 대담
관리자
0
5909
2004.07.03 17:08
[쟁점 대담]<5>‘건축물 미술품’ 정부개입 어디까지…
《미술계에 최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전국 대도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에게 강제적으로 건축비의 0.7%에 해당하는 비용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된 지 20년째가 된다.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안을 놓고 미술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도개선책으로 중개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미술협회 공공미술제도 개선대책위원회 오형태(吳亨泰·54·조각가) 위원장, 건축주들의 비용을 0.7%에서 0.5%로 낮추는 대신 현금으로 거둬 이를 기금화해 전담기구를 통해 집행하자는 미술평론가 박찬경(朴贊景·39·대안공간 풀 디렉터)씨가 만나 토론을 벌였다.》
▽ 박찬경=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일부 작가에게만 일이 몰리고 여기에 중개수수료, 리베이트 때문에 일을 맡은 작가들도 덤핑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작품의 질이 떨어져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다.
▽ 오형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었다. 도시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 박=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부정적 의견들이 나왔다. 작품 관리실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축주는 세워 놓고도 관심이 없고, 시민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공공시설청이 있고 지역마다 문화부 소관 아래 전문가그룹들이 있다. 공공미술을 코디네이터하고 감리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오= 개인 건축물 앞에 세우는 미술품을 공공개념으로 본다는 것부터 반대다. 이미 현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산에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마당에 공공미술전담 기구를 만들고 건축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응하겠는가.
▽ 박= 대형 건물은 이미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다. 사용하는 이, 보는 이의 문화적 향수권도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현행 건축비의 0.7%를 0.5%로 낮춰 돈으로 내자는 제도개선 사항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건축주들에겐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오 = 현실적으로 돈으로 내는 건축주가 많지 않을 것이다.
▽박 = 돈으로 내겠다는 건축주도 많다.
▽오 = 설사 돈으로 낸다 해도 또 다른 탈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시장규모만 축소되는 꼴이 될 것이다.
▽박 = 건축주들에게 문화적 동기가 제공된다면 시장이 줄어 들 리 없다. 일부에선 기금운영센터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화된다고 우려하는데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 무섭다고 미리 피할 일이 아니다. 건축주들이 낸 돈이 기금화되면 건축물을 세울 장소 선정에서부터 작품선정, 감리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나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을 것이다.
▽오 = 제도를 해결한다고 옥상옥(屋上屋)을 세울 게 아니라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개업체를 양성화해 등록제를 시행하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정하자는 것이다. 또 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제도가 예술 파트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전국 심의위원 뱅크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박 = 그런 차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전문가 몇 사람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의 문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미술계에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논쟁을 ‘코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다면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 = 함께 고민하자고 하면서도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화부 쪽에서 오히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문화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봤지만 답변 한번 없었다. 그러다가 진보계열의 미술인회의 등에서 공공미술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자 즉각 문화부가 공청회까지 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른바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 = 마치 미술인회의를 문화부 대변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두 사람은 처음 현실진단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토론이 진행되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총론에는 합의를 봤다. 또 정부청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미술작품 세우는 것을 입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 제도개선안에 들어가선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는 현실과 이상을 보는 세대간의 시각차, 사안을 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까지 있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이번 토론을 통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많은 대화를 해 나갈 것을 절감하며 논쟁을 맺었다.
정리=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동아일보 06/06 펌
《미술계에 최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전국 대도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에게 강제적으로 건축비의 0.7%에 해당하는 비용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된 지 20년째가 된다.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안을 놓고 미술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도개선책으로 중개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미술협회 공공미술제도 개선대책위원회 오형태(吳亨泰·54·조각가) 위원장, 건축주들의 비용을 0.7%에서 0.5%로 낮추는 대신 현금으로 거둬 이를 기금화해 전담기구를 통해 집행하자는 미술평론가 박찬경(朴贊景·39·대안공간 풀 디렉터)씨가 만나 토론을 벌였다.》
▽ 박찬경=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일부 작가에게만 일이 몰리고 여기에 중개수수료, 리베이트 때문에 일을 맡은 작가들도 덤핑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작품의 질이 떨어져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다.
▽ 오형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었다. 도시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 박=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부정적 의견들이 나왔다. 작품 관리실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축주는 세워 놓고도 관심이 없고, 시민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공공시설청이 있고 지역마다 문화부 소관 아래 전문가그룹들이 있다. 공공미술을 코디네이터하고 감리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오= 개인 건축물 앞에 세우는 미술품을 공공개념으로 본다는 것부터 반대다. 이미 현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산에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마당에 공공미술전담 기구를 만들고 건축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응하겠는가.
▽ 박= 대형 건물은 이미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다. 사용하는 이, 보는 이의 문화적 향수권도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현행 건축비의 0.7%를 0.5%로 낮춰 돈으로 내자는 제도개선 사항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건축주들에겐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오 = 현실적으로 돈으로 내는 건축주가 많지 않을 것이다.
▽박 = 돈으로 내겠다는 건축주도 많다.
▽오 = 설사 돈으로 낸다 해도 또 다른 탈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시장규모만 축소되는 꼴이 될 것이다.
▽박 = 건축주들에게 문화적 동기가 제공된다면 시장이 줄어 들 리 없다. 일부에선 기금운영센터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화된다고 우려하는데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 무섭다고 미리 피할 일이 아니다. 건축주들이 낸 돈이 기금화되면 건축물을 세울 장소 선정에서부터 작품선정, 감리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나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을 것이다.
▽오 = 제도를 해결한다고 옥상옥(屋上屋)을 세울 게 아니라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개업체를 양성화해 등록제를 시행하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정하자는 것이다. 또 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제도가 예술 파트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전국 심의위원 뱅크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박 = 그런 차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전문가 몇 사람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의 문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미술계에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논쟁을 ‘코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다면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 = 함께 고민하자고 하면서도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화부 쪽에서 오히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문화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봤지만 답변 한번 없었다. 그러다가 진보계열의 미술인회의 등에서 공공미술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자 즉각 문화부가 공청회까지 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른바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 = 마치 미술인회의를 문화부 대변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두 사람은 처음 현실진단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토론이 진행되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총론에는 합의를 봤다. 또 정부청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미술작품 세우는 것을 입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 제도개선안에 들어가선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는 현실과 이상을 보는 세대간의 시각차, 사안을 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까지 있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이번 토론을 통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많은 대화를 해 나갈 것을 절감하며 논쟁을 맺었다.
정리=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동아일보 06/06 펌